'개봉 박두' 한국영화 가운데 기성 감독 작품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모두 데뷔 감독이거나 막 데뷔를 끝낸 신진급 감독 작품들뿐이다. 다음 달 개봉을 앞둔 영화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난다.
올해 초부터 이달까지 개봉한 영화 중 기성 감독 작품은 강우석 감독의 ‘글러브’ 이준익 감독의 ‘평양성’ 장진 감독의 ‘로맨틱 헤븐’ 그리고 장률 감독의 ‘두만강’ 이 전부다.
앞서 한 독립영화 감독과 만난 적이 있다. 독립영화라기보단 상업 시장 폐단에 환멸을 느낀 '예술 감독'이라고 표현하겠다. 이 감독 역시 자신을 그렇게 부르길 원했다. 당시 그 감독은 현재 한국영화계의 문제점 가운데 가장 큰 덩어리를 메이저 제작사에서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감독의 말을 빌린다.
"분명 영화는 상품이다. 관객이란 수요층이 돈을 지불하고 관람하는 무형의 콘텐츠 상품. 하지만 대한민국 영화 시장 자체가 너무 이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다. 때문에 영화가 공장에서 찍어내는 천편일률적인 맞춤형 상품으로 전락했다."
한국 영화 시장을 지배하는 메이저 제작사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이다.
그럼 그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은?.
대중 예술가로서 존경받던 시절이 분명 있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분명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장률 감독을 영화계 인사들은 ‘시네아스트’라 부른다. 하지만 그를 흥행 감독이라 부르는 사람은 없다. 언제부턴가 영화란 대중 예술이 흥행을 기준점으로 등수가 나눠지게 됐다.
결국 메이저 제작사 입장에선 대중 예술로서의 영화보단 자신들의 이윤 추구에 적합한 영화를 원할 수밖에 없다. 지금의 대한민국 영화 시장은 그렇다.
지난 1월 영화 ‘평양성’을 내놓은 이준익 감독이 말했다.“'왕의 남자' 흥행으로 사극의 상품 가능성을 시장에서 인정받았다. 하지만 연이은 패배가 지속된다면 누가 내게 투자를 하겠나.”
이 감독은 자신의 불안한 미래를 예견한 듯 평양성이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자 트위터를 통해 상업영화 은퇴를 선언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최근 신인 감독들의 데뷔 러시는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메이저 기획사가 자존심 강한 기성 감독보단 말 잘 듣는 데뷔 감독들을 통해 자신들이 가진 상업적 데이터에 적합한 상품 제작에만 전념하겠다는 상황으로 보여진다.
모 감독은 실제로 기획사로부터 이런 강요를 받은적도 있다면서 결국 이 같은 상황이 머지않아 한국영화 시장의 붕괴를 가져 올 것이라 거듭 주장했다.
최근 맞춤 기획상품으로 뜨거웠던 '아이돌' 가요시장에 기성 원로(?)가수들의 '나는 가수다' 도전이 화제다. 특히 지난주 임재범의 거친 야성미는 절로 나는 눈물과 감동을 선사하며 가수는 살아있다를 증명했다. 쥐어짜는 웃음과 눈물이 아닌, 절로 가슴을 울리는 영화는 볼 수 없는걸까. 자본과 맞짱 뜰 '거친 감독'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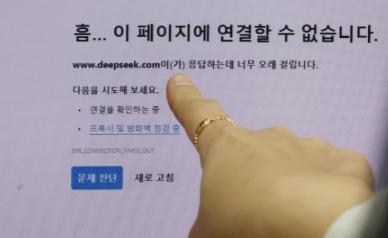





![[포토] 故 하늘 양을 추모하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7/20250217154605634152_518_323.jpg)
![[포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별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7/20250217104313685834_518_323.jpg)
![[포토] 은으로 번진 골드바 품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6/20250216210750953390_518_323.jpg)
![[포토] 불법 촬영 황의조,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4/20250214145226377542_518_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