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들 국가는 대규모 외화자산을 바탕으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저지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발언권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전월대비 85억8000만달러 늘어난 3072억달러로 집계됐다. 사상 처음 3000억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보유액 순위에서 세계 7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했다. 외환보유액 증가세는 동북아와 브릭스 전반에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에 따르면 중국은 3월 말 기준으로 533억 달러가 증가한 3조447억 달러의 외환을 보유해 명실상부한 외환보유액 1위를 유지했다.
또한 2위인 일본은 245억 달러가 늘어난 1조1160억 달러, 3위인 러시아는 87억원 증가한 5025억 달러를 기록했다. 대만은 3926억 달러, 브라질 3171억 달러, 인도 3075억 달러로 각각 4~6위를 보였다. 스위스는 2802억 달러, 싱가포르 2334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을 기록했다.
동북아 3국의 외환보유액은 4조4679억 달러에 이르고 동북아 국가와 브릭스 국가를 합친 외환보유액은 5조5950억 달러에 달한다.
한 외환전문가는 "동북아 국가와 브릭스 국가가 대규모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미국과 금융 및 무역 시장에서 보호무역주의를 저지할 수 있는 상당한 발언권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들 국가의 외환보유액 급증은 아시아 통화의 강세와 글로벌 달러의 약세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수익성보다 유동성에 집중하고 있는 외환보유액이 급증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만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는 “외환보유액이 증가하면 해당 국가의 통화가치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면서 "특히 한국의 경우 미국채 중심의 달러 자산이 많아 금이나 위안화 등 다른 자산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외환보유액이 늘면서 원화값은 달러당 1060원대까지 올랐고 4월말 기준 유로화는 4.5%, 파운드화는 4.2%, 엔화는 2.6%가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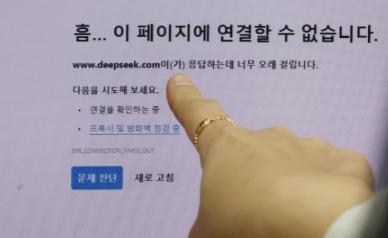





![[포토] 故 하늘 양을 추모하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7/20250217154605634152_518_323.jpg)
![[포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별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7/20250217104313685834_518_323.jpg)
![[포토] 은으로 번진 골드바 품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6/20250216210750953390_518_323.jpg)
![[포토] 불법 촬영 황의조,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4/20250214145226377542_518_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