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보다는 약국에서 먼저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시행되는 방향으로 사실상 가닥이 잡혀 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최근 의사협회 등 6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 '제도시행일 이전에 계약이 이뤄진 의약품은 약가인하 및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국공립병원 원내사용약 경쟁입찰 유찰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내린 긴급 처방이었다.
이는 병원의 의약품 구매계약이 통상 1년 단위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최대 1년간 새 제도 시행을 유예하는 조치다.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하는 국공립병원이나 삼성서울, 서울아산 등 일부 사립병원 뿐 아니라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다른 병원 거래분도 예외는 아니다.
△적용시점 제각각
구매계약 시기가 병원별로 제각각인 점을 고려할 때 편입시기도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국내 보험제도의 근간 중 하나인 새 보험약 상환제도가 같은 날 전체 요양기관에 동시 적용되지 않고 개별기관의 계약일에 따라 2차 년도까지 유예된다.
예를 들어 이달에 입찰이 진행되는 서울대병원은 1년간 계약을 맺을 경우 내년 2~3월 이후, 보훈병원은 같은 조건에서 내년 6월 이후가 돼야 새 제도가 적용된다.
유통의약품의 약 70%를 취급하는 약국은 상황이 또 다르다.
개국약사들에 따르면 약국은 통상 1개월에서 길어야 3개월 단위로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십상이다.
병원과는 달리 제도 시행후 최대 3개월 이내에 모두 약가인하와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새 제도 영역으로 편입된다는 것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정부 계획대로 오는 10월1일 시행되더라도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복지부의 계산은?
복지부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앞서 문제가 되고 있는 모순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리베이트 거래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병원과 제약·도매업체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에 의약품 공급자(제약·도매)는 계약기간을 되도록 길게 잡고 싶겠지만, 인센티브를 받아야 하는 병원은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공급계약을 10월 이전에 종료시키고 제도 시행 뒤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의 기대처럼 된다면 제도시행 직후 대부분의 요양기관들에 동시다발적으로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이런 가정보다는 약가인하를 1년에서 수개월이라도 면해보려는 제약사와 의료기간의 야합에 의한 신종 리베이트가 양산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 게 사실이다.
△시각차에 의한 오류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복지부의 TFT가 이 문제를 예측하지 못했거나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고 집행부서가 비난여론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지나친 선제대응에 나섰을 수도 있다"며 "두 집단간의 시각차로 인한 것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가 제시한 유예조치 역시 다른 해석를 낳고 있다.
땜질처방을 해서라도 정부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것이다.
실제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이 예전대로 입찰에 참가해 무난히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고 예정대로 10월에 제도가 시행되면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현실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내년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올해와 마찬가지의 사태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이미 제도가 세팅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 시행전인 지금과는 양상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cys4677@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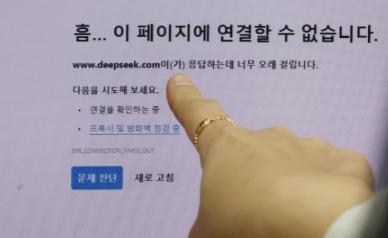





![[포토] 故 하늘 양을 추모하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7/20250217154605634152_518_323.jpg)
![[포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별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7/20250217104313685834_518_323.jpg)
![[포토] 은으로 번진 골드바 품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6/20250216210750953390_518_323.jpg)
![[포토] 불법 촬영 황의조,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4/20250214145226377542_518_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