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수·합병(M&A)시장에 업계 판도를 뒤바꿀 대형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열기는 시통찮다.
대어를 낚으려는 강태공들의 물밑 작업이 뜨거워질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과거의 실책을 교훈삼아 몸집 키우기에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대우건설 인수의향서(LOI) 접수를 마감한 결과 외국 자본에 팔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다. 하이닉스와 현대종합상사의 매각에도 각각 효성그룹과 현대중공업이 단독 입찰하면서 일찍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지난해 7월 GS글로벌(옛 쌍용)을 인수한 GS그룹과 같은해 10월 대우조선해양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포기한 한화그룹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해운업 시황이 좋지 않은데다 강경 노조의 반대 등으로 매각 작업이 쉽지 않은 상태다. 금호생명과 현대건설, 쌍용건설 등도 가격 협상으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처럼 M&A 흥행이 저조한 것은 M&A를 통한 자산 불리기에 열을 올렸던 기업들이 인수 이후 계열사를 토해낼 수 밖에 없던 전례를 의식한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인수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무리수를 둔 탓에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결국 대우건설을 내놓는 수순을 밟게 된 것이 대표적이다.
기업들은 회복세를 보이는 현 경제 상황에서 M&A를 통한 전사적 사업구조 개편이냐, 숨통을 틔우기 위한 전략적 보류냐 라는 두가지 현안에 맞닥뜨린 셈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경기 불황시에는 낮은 비용으로 좋은 신사업 기회를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무리하게 다른 사업에 손을 대는 M&A는 자본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등 실패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은 불황 이후 다가올 호황기를 대비해야 할 때다. 100년을 내다보는 혜안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 기업의 기동력을 높여야 할 시점에 보수적인 태세를 보이다 자칫 호기를 놓칠까 우려된다.
기업의 M&A 전략이 신중해졌다는 점은 바람직하지만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기업의 개척 정신마저 사라져 버린 건 아닌지 되묻고 싶다.
아주경제=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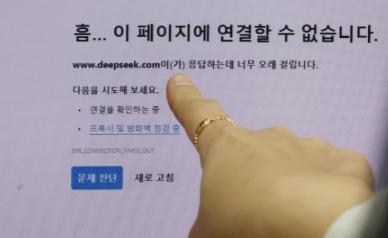





![[포토] 故 하늘 양을 추모하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7/20250217154605634152_518_323.jpg)
![[포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별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7/20250217104313685834_518_323.jpg)
![[포토] 은으로 번진 골드바 품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6/20250216210750953390_518_323.jpg)
![[포토] 불법 촬영 황의조,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4/20250214145226377542_518_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