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구제금융이 '투명성' 논란에 휩싸였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모두 2조달러(약 240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 약속과 달리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구제금융 대상인 씨티그룹이 최근 지방은행 인수에 나서면서 이같은 논란은 더욱 불거졌다. 구제금융의 당초 목적인 신용 확대에 사용하지 않고 사업확대에 공적자금을 쓰고 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1일 보도했다.
 |
||
| 사진: 씨티그룹 등 부실 금융기관에 엄청난 구제금융이 투입된 가운데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
벤 버냉키 연준 의장과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지난 9얼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안과 관련 감독의 필요성과 투명성 제고가 중요함을 밝혔지만 구제금융이 결정되고 2개월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실질적인 지원자금은 예상을 훨씬 넘어선 상태.
더군다나 어떤 식으로 자금이 집행됐는지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연준에 구제금융 내용을 공개하는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연준의 구제금융과 관련 투자에 영향을 받고 있는 업계 종사자들은 물론 전문가들 역시 당국의 구제금융 운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루미스 세일리스 앤 코의 댄 퍼스 부회장은 "연준이 담보로 확보한 채권에 대해 모든 것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준은 부실 금융기관의 매입하는 방식으로 경매 또는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쪽을 택하는 역경매 방식을 사용한다고만 밝힌 상태다.
연준과 재무부측은 구체적인 구제금융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청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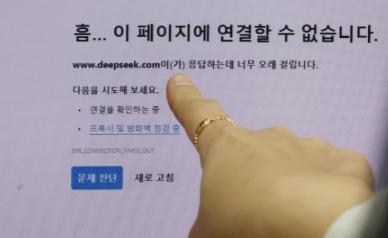





![[포토] 故 하늘 양을 추모하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7/20250217154605634152_518_323.jpg)
![[포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별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7/20250217104313685834_518_323.jpg)
![[포토] 은으로 번진 골드바 품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6/20250216210750953390_518_323.jpg)
![[포토] 불법 촬영 황의조,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4/20250214145226377542_518_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