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90년생 '고객'이 온다
2019-09-10 14:26
얼마 전 아는 후배의 회사에 1993년생 신입 사원이 들어왔다. 새로운 인재 영입에 신이 난 팀장은 "퇴근 후 환영식!"을 외쳤지만 이내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저 오늘 약속 있습니다. 회식은 미리 날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대답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에 나를 포함한 선배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신입 사원과 비슷한 나이대의 동생은 "맞는 소리를 했다"며 깔깔 웃었다.
이런 세대 간 인식의 차이가 책 '90년생이 온다'를 베스트셀러로 만들었을 거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에게 선물해 화제가 되긴 했지만 그전부터 청년 세대와의 소통을 위한 'CEO 필독서'로 이름을 날렸다.
금융권에도 1990년대생은 빠르게 오고 있다. 문제는 은행이 90년대생 '직원'이 오는 것은 알아도 90년대생 '손님'이 온다는 사실은 모른다는 점이다.
기업의 수장은 이제 막 '취준생'에서 벗어난 직원들과 격의 없는 토론을 이어가고 있지만, 고객들이 체감하는 만족감은 여전히 낮다. 은행이 90년대생을 '주요 금융서비스 이용 고객'이 아닌 '잠재고객'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20대 고객을 잡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사실은 그동안의 영업 행태만 봐도 알 수 있다.
20대를 위한 전용 카드상품을 출시했다거나 대학 캠퍼스 지점 운영을 위해 출연금 수십억~수백억원을 냈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이들을 위해 종합 상품을 개발했다거나 채널을 운영한다는 소식은 찾아보기 힘들다. 90년대생이 선호하는 여행, 엔터테인먼트 소비와 관련된 카드 혜택도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힘든 20대를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 디지털 서비스도 부족하다.
단순히 밀레니얼 세대로 폭넓게 묶어버리기엔 이들은 훨씬 더 디지털에 기민하게 반응한다. 길고 복잡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재미를 추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90년대생은 인터넷뱅킹조차 귀찮아한다. 하지만 소장 욕구를 '자극'하거나 '재미'있게 저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기꺼이 자신의 돈과 시간을 쏟아붓는다. 결국, '신뢰'라는 수식어에 숨어 보수적 영업행태만 고집하면 은행도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90년대 '직원'은 행장과의 스킨십이 없어도 열심히 일한다. 행장과의 스킨십이 없을 때 더 열심히 일할 수도 있다. 그러나 90년대 '고객'은 행장의 고민이 없으면 멀어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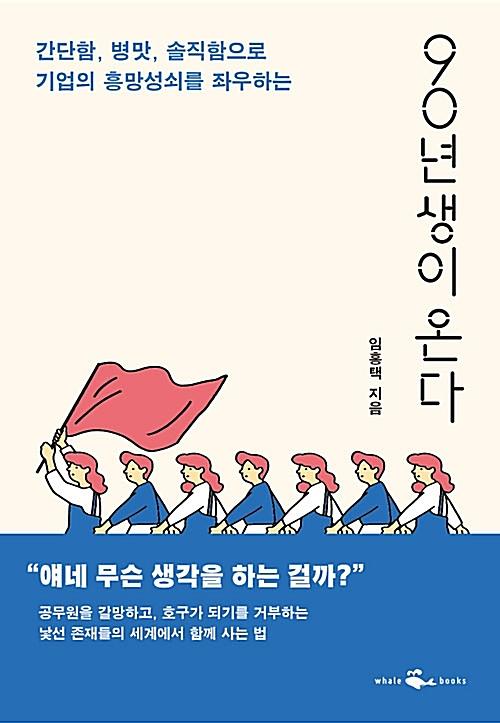
임홍택의 '90년생이 온다'[사진=웨일북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