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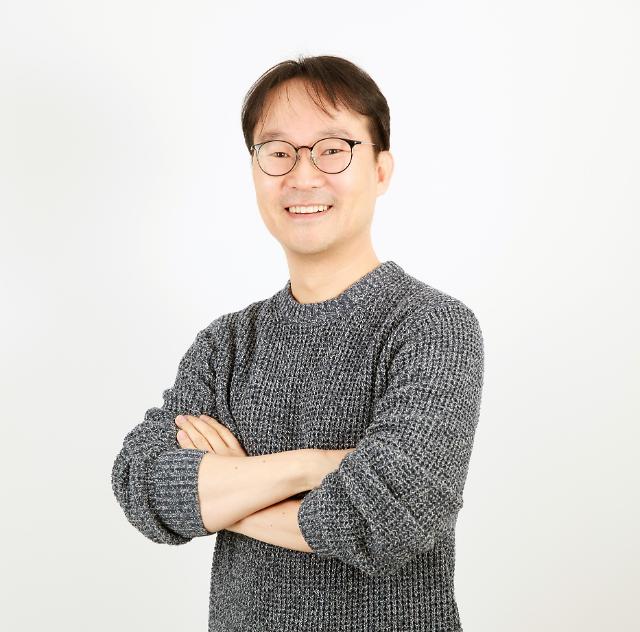
이용관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대표 [사진=블루포인트파트너스]
누구든 블루포인트파트너스에 처음 합류하면 액셀러레이터(AC)의 ‘프로의식’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진다. 심사역은 물론이고 재무팀, 인사팀, 개발자도 예외는 없다. 조직이 스타트업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느냐에 액셀러레이팅이라는 업의 성패가 달렸다고 보기 때문이다. 며칠에 걸친 경영진과의 대화 속에서 구성원들은 초기 투자에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익힌다.
무엇보다 블루포인트 가족이라면 ‘저 스타트업은 내가 키웠지’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위험하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이런 생각을 내비치고, 함부로 입에 올리기도 한다. 거액의 투자금을 매개로 하다 보니 스타트업과의 관계를 마치 ‘갑-을’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다. 투자사의 역할은 스타트업이 성공으로 가는 여정에 존재하는 많은 요소 중 일부로 봐야 하는데 말이다.
투자·심사의 전문성만이 스타트업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다는 것도 흔히 갖는 오해다. 오늘날에는 넘치는 정보와 수많은 변수 속에서는 열린 자세로 세상의 모든 지식을 활용하려는 태도가 필수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이들의 눈높이에서 고민과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는 ‘라포’(Rapport)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
그렇게 블루포인트의 스타트업 투자는 ‘고르기’(Picking)에서 ‘더하기’(Adding)로 무게추를 옮겨왔다.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을 알아보지 못해 아쉬워하기보다는 우리가 투자한 스타트업에 어떻게 가치를 더할까 고민하는 편이 낫다고 본다.
다만 세상의 속도는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과 정성만으로 따라잡기에는 지나치게 빠르다. 매년 더 많은 숫자의 스타트업이 생겨난다. 초기 투자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스타트업 생태계의 모든 영역을 감싸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지난해 국내 기술 창업만 해도 23만9620개로 역대 최대치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 디지털전환, 유니콘의 급증, 유동성의 위기 등이 불과 몇 년 새 이어졌다. 결국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기보다는 시스템을 통해 스타트업을 돕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데스밸리(죽음의 계곡)를 코앞에 둔 초기 스타트업에는 더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대전의 카이스트를 거점으로 창업가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공간 사업인 ‘시작점’, 투자 데이터 관리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IT 솔루션 ‘래티스’, 사업 초기에 필요한 가이드 전반을 제공하는 ‘블루패밀리케어’ 등은 블루포인트가 만들고 있는 스타트업 지원 시스템의 일부다.
사실 이는 전통적 투자 관점에서 보면 모두 거추장스러운 비용일지도 모른다. 날카로운 선구안으로 좋은 스타트업을 잘 투자하면 되는데, 불필요한 일을 늘릴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액셀러레이터는 초기 투자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스타트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다.
‘농사는 땅심(지력)’이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좋은 품종의 작물이라도 토양이 건강하지 않으면 제대로 자랄 수 없다는 얘기다. 지난해만 7조원이 뿌려지는 역대급 호황 속에서 통했던, 기존 성공 방정식에 조금씩 의문 부호가 달리고 있다. 스타트업의 뿌리가 단단히 내릴 시스템이라는 토양을 갖추는 일, 이제 투자사의 몫이 아닐까.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